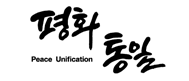파도의 아이들 정수윤 지음/ 220쪽/ 돌베개
파도의 아이들 정수윤 지음/ 220쪽/ 돌베개
북한 리얼 스토리
눈부신 청춘들, 꿈과 자유의 바다로 항해
번역가이자 에세이스트인 정수윤 작가가 13년 동안 100여 명에 달하는 탈북 청소년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10대 탈북청소년 세 명의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담화에 이어 경의선 도로 폭파,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의 완전사격 준비태세 등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커가고 있다. 또한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는 북·러 군사밀착 도발도 벌이고 있다.
북한이 외부와의 단절이 심화될수록 주민들의 삶, 특히 ‘장마당 세대’라고 불리는 북한 MZ세대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외부 문화를 접촉한 경험이 많다. 겉으론 당국의 지시를 따르지만 속으론 불만과 저항 성향을 갖고 있다. 특히 경제적 이익 침해에 민감하며 문화적 요구도 강하다. 북한 당국이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을 만들어 강력히 단속하고 통제하고 있는 이유다. 북한 MZ세대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소설은 그곳을 과감히 뛰쳐나와 더 넓은 세계로 떠나는 세 청춘의 뭉클한 여정을 담고 있다.
“나는 간다, 죽지 않고 살면 또 보자.” 풀썩- 그 애는 차가운북한이 외부와의 단절이 심화될수록 주민들의 삶, 특히 ‘장마당 세대’라고 불리는 북한 MZ세대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외부 문화를 접촉한 경험이 많다. 겉으론 당국의 지시를 따르지만 속으론 불만과 저항 성향을 갖고 있다. 특히 경제적 이익 침해에 민감하며 문화적 요구도 강하다. 북한 당국이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을 만들어 강력히 단속하고 통제하고 있는 이유다. 북한 MZ세대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소설은 그곳을 과감히 뛰쳐나와 더 넓은 세계로 떠나는 세 청춘의 뭉클한 여정을 담고 있다.
돌멩이 같은 말을 톡 던지곤, 뒤돌아 한 마리 짐승처럼
뛰어내렸다. 뒤에 남은 우리는 그 애가 뛰어내린 쪽으로
몰려갔다. 안개 속 그 애는 흙바닥에 동그마니 웅크려 있나
싶더니 몸을 펴자마자 냅다 산으로 뛰었다. 그 애는 점점 더
작아졌고, 우리는 점점 더 조급해졌다.
달리는 트럭에서 탈출하기 더 없이 좋은 상황이 펼쳐졌다. 안개 속에서 군인이 둘, 하나는 운전 중이고 하나는 술에 취해 곯아떨어졌다. 지난 열여섯 해 동안 이 망할 놈의 세상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때를 읽는 기술이다. ‘잡히면 죽도록 매 맞을 텐데’라는 생각도 사치다. 갈 데를 정해두고 도망치겠다는 건 배부른 소리다. 트럭에서 냅다 뛰어내려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퍽 소리가 났지만 아픈 줄 몰랐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새처럼, 바람처럼 시베리아 벌판을 미친 듯이 내달렸다.
얼마나 달렸을까. 아까 먼저 뛰어내린 여름이 보였다. 이 얘는 셀 수 없이 강을 건넜다. 셀 수 없이 죽음의 문턱을 오갔다는 뜻이다. 나는 겨우 두 번째. 처음엔 금방 풀려났지만 두 번째는 손이 묶인 채 마을 광장으로 끌려가 공개 재판을 받았다. 어릴 때부터 나를 잘 아는 사람들도 돌을 던졌다. 썩을 년, 나라 팔아먹은 개간나! 마을 어귀의 개 짓는 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한 무리의 시커먼 사람들이 우리 집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있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커먼 사람들이 꽝꽝꽝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산등성이까지 올라왔다.
주근깨 가득한 금향 언니의 얼굴이 꽃처럼 활짝 피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아까 먼저 뛰어내린 여름이 보였다. 이 얘는 셀 수 없이 강을 건넜다. 셀 수 없이 죽음의 문턱을 오갔다는 뜻이다. 나는 겨우 두 번째. 처음엔 금방 풀려났지만 두 번째는 손이 묶인 채 마을 광장으로 끌려가 공개 재판을 받았다. 어릴 때부터 나를 잘 아는 사람들도 돌을 던졌다. 썩을 년, 나라 팔아먹은 개간나! 마을 어귀의 개 짓는 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한 무리의 시커먼 사람들이 우리 집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있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커먼 사람들이 꽝꽝꽝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산등성이까지 올라왔다.
언니는 나와 같은 경로로 이 마을까지 흘러들었는데,
재작년인가 가게에 술을 대는 청년이랑 눈이 맞아 결혼했다.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도 언니는 이 나라
사람과 가정을 꾸려 안정감을 느낀다고 했다. ‘잡혀갔다더니
용케 살아 돌아왔구나.”
함께 도강한 언니를 따라 여기까지 왔었다. 눈을 감으면 화장실, 부엌, 2층 숙소와 옷장, 창문 모기장에 뚫린 담뱃불 자국까지 기억한다. 상한 만두를 먹고 배탈이 나서 바닥을 뒹굴면서도 병원에 못 가 며칠을 끙끙 앓으며 울기만 하던 일. 2층 창문으로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진 일이 어제처럼 생생하다. 녹색 문이 열리면서 마담이 모습을 드러냈다. ‘예쁜 몸이 뼈밖에 안 남았네.’ 이 사람은 날 돈벌이로만 취급하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닭고기 넣고 국물 좀 우려서 쌀밥이랑, 어서 먹자”고 했다. 군침이 넘어갔다. 잡혀간 이후 고기며 쌀밥은 입에 대본 적도 없다. 배 속의 세포가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도대체 어디로 끌려갔을까. 나는 이제 어디로가야 하나. 이 비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마저 들지 않는다.
그냥 물웅덩이 위로 엎어져 죽어버릴까. 모든 걸 포기해버릴까.
어둠 속으로 영원히 숨어버릴까. 우산을 쓰고 걷는 사람들은
나를 미친놈 보듯 흘끗거리지만 그런 건 상관없다. 이렇게
나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
광민은 열차에서 구해준 남자와 말이 통했다. 같은 영상을 수십 번쯤 보았고, 등 뒤로 어머니가 공안에 잡혀가는 동안에도 눈길은 (손흥민) 등번호 7만 쫓았다. 하지만 마음은 지구가 멸망한 듯한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덜덜 떨고 있었다. 열차가 종착역에 다다라오자 야구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배낭을 선반에서 내렸다. 그때 어머니가 앉았던 의자 밑에서 어머니 지갑을 발견했다. 공안에게 잡혀가면서도 지갑을 흘려준 것이다. 역 밖으로 나갔을 때부터 후드득후드득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정말로 혼자다. 배낭 속 소니뿐이다.
앞에 놓인 맑은 술을 한입에 털어 넣으며 10대라는 것, NORTH KOREA 사람이라는 것, 축구를 했다는 것, 그리고 손흥민이 사진이 벽에 붙어 있다는 것, 형의 사진을 떼어내야 한다는 것까지 이야기하고는 펑펑 울었다. 울고 나니 속이 시원했고 기분이 후련했다. 셋이 얼싸안고 울고 웃었다. 다음 날 다시 두 여성을 만났다. 다른 반쪽의 나라에서 나를 받아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게 정말이라면 나도 이 누나들처럼 세상 어디든 배낭여행을 하고 도망 다니지 않고, 나의 형 소니 손흥민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있다.
수용소에 갇힌 지 벌써 석 달입니다. 여기서 견딜 수 앞에 놓인 맑은 술을 한입에 털어 넣으며 10대라는 것, NORTH KOREA 사람이라는 것, 축구를 했다는 것, 그리고 손흥민이 사진이 벽에 붙어 있다는 것, 형의 사진을 떼어내야 한다는 것까지 이야기하고는 펑펑 울었다. 울고 나니 속이 시원했고 기분이 후련했다. 셋이 얼싸안고 울고 웃었다. 다음 날 다시 두 여성을 만났다. 다른 반쪽의 나라에서 나를 받아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게 정말이라면 나도 이 누나들처럼 세상 어디든 배낭여행을 하고 도망 다니지 않고, 나의 형 소니 손흥민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있다.
있는 건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생긴 덕분입니다.
‘눈’과 ‘여름’이라니. 둘이 상극일 것 같은데 아주
찰떡처럼 붙어 다녀요. 우리 셋은 나이는 같아요.(중략)
철썩. 철썩. 바다는 공평하게 우리 모두에게 인사했다.
똑같은 언어로 똑같은 뜻을 전달하며. 이 바다를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가슴이 뜨겁게 차올랐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나라야!”
작가는 오랜 시간 이어진 수많은 이들의 탈북 여정을 ‘설’, ‘광민’, ‘여름’이라는 주인공으로 형상화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세 친구가 고향을 떠나 바다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순간까지 여정은 한숨과 탄식이 나온다. 지금도 또 다른 아이들은 국경을 넘는 꿈을 꿀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절망스러운 환경이다. 폭제와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북녘의 청소년들에게 우리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그 소리마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은 깊은 바다보다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