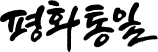그림은 언제나 삶의 버팀목
숟가락 작가의 남한 정착기
오성철 작가
전형적인 예술가의 모습 그대로였다. 소박하고 내성적인 성격에 조곤조곤 말하는 말투까지. 흔히 머릿속으로 그리는 ‘예술가라면 이런 사람일 것 같다’라는 그런 사람. 그림은 그의 삶에서 언제나 버팀목이었고, 남한으로 들어오면서 또 다른 삶을 꿈꿀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통일이 되면 평양의 미대 초대 학장이 되고 싶어요."
하루를 ‘살아내야’ 했던 북의 일상
오성철 작가는 ‘숟가락 작가’로 불린다. 그의 작품의 주요 오브제가 숟가락이기 때문이다. 어떤 주제와 구성이든 숟가락은 어김없이 등장한다. 철이나 스테인리스가 아닌 일회용 플라스틱 숟가락이다. 모든 건 이유가 있었다.
“남북한이 공통으로 겪는 게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 말에 천착했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게 대체 뭘까. 그건 그 자체로 삶을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의 작품을 관통하는 오브제로 그걸 선택하게 된 건 충분한 배경이 있었다. 그가 북에서 태어나 남으로 올 때까지 겪어야 했던 삶의 무게. 듣고 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평양 아래, 대동강 하류의 국제 무역항인 평안도 남포시에서 태어났다. 부산 출신이었던 그의 할아버지는 남포의 소작농 집안에서 태어난 할머니를 사랑했고 그래서 그곳에 남았다. 둘 사이에 태어난 3남 2녀. 그중 큰아버지 둘은 다 정치범으로 세상을 떴다. 북한은 신분제 국가다. 정치범이 둘이나 나온 집안이 멀쩡할 수는 없었다.
늘 눈치를 봐야 했고 풍족할 수 없는 삶에 심지어 어머니마저 오 작가를 낳은 직후 집을 떠나버렸다. 젖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그는 영양실조까지 걸려야 했고, 병원에서도 얘는 죽을 거라고 했지만 끝내 밥을 먹으며 살아남았다고 했다. 친구도 별로 없이 항상 집에만 있어야 했던 그가 어릴 적부터 벽에 발라둔 시멘트 포대에 낙서를 했던, 그래서 자연스레 그림의 세계로 발을 들인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그림은 하루를 살아내야 했던 일상을 버티게 한 버팀목이었다.
갇혀 있던 3년의 삶, 비로소 품은 삶의 방향
10대 초반부터 살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던 그의 일상은 군에 입대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도 어릴 때부터 곧잘 그렸던 그림 실력 덕에 그는 여기저기 불려 다니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문제는 입대 직후 시작한 ‘고난의 행군’. 군 내에서도 영양실조가 속출했고 한 소대에 탈영자가 두세 명씩 나오던 시기였다. 그때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다행이었다. 버티고 또 버티는 삶의 연속. 무탈하게 군에서 나와서는 살기 위해 중국으로 밀수하는 배를 타고 오가기도 했다. 그가 남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한 건 그 와중이었다. 두 번째로 중국에 들어갔을 때, 그는 심양의 한국영사관으로 향했다. 분명 영사 측에 탈북의 의사를 밝혔고, 모든 준비를 해서 어렵사리 대사관 앞까지 갔지만 그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 철조망이 세 겹 네 겹 에워싸고 있었고, 입구를 지키는 병력을 뚫고 들어갈 수는 없었다. 뒷문을 보니 원형으로 돌아가는 문이 아직 채 닫히지 않았기에 잽싸게 몸만 날려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그는 이내 자유의 삶을 얻게 될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그는 3년이라는 시간을 영사관 지하에 갇혀서 지내야 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은 1년 반 만에 남한으로 갔지만, 그는 아니었다. 그 상황에서 그를 버티게 한 건 역시 그림이었다.
“사람이 성숙해지더라고요. 자기 성찰을 참 많이 했어요. 2014년에 비로소 남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그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림이 날 살렸네’. 그 순간 ‘나는 예술가로 살겠다’라고 삶의 방향을 정했어요.”
오 작가는 하나원을 나오자마자 대전의 한남대를 찾아가 미대에 입학했다. 처음으로 예술가의 길을 걷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물감을 사고 학비를 마련하면서 생활비까지 벌기 위해 공사판 노동일에 칵테일 바, 레스토랑 서빙 등 안 해 본 일 없이 다 하며 버텼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예술가로서의 삶을 꽃피우는 중이다.
“한국에 정착한 이후로도 녹록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끈질기게 버티고 또 버티다 보니 고마운 아내를 만나 가족을 이루는 날도 오더라고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예술가의 꿈을 꾸는 북쪽 사람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북한 사람들이 집중도가 아주 높고 기술도 뛰어나거든요. 길만 잘 열어준다면 한반도의 예술계에 새로운 사조가 등장할 거라 믿습니다.”
담담한 말투 끝, 그의 입가에 슬쩍 미소가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