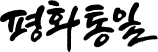시대를 초월해 이어지는 애국심과 통합의 정신
뜨거웠던 독립운동과 민족을 아우른 일심(一心) 사상
진관사 태극기와 백초월 스님
지난 6월 6일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의 양복에 달린 태극기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서울 은평구 소재의 진관사에서 발견된 이른바 ‘진관사 태극기’였다. 진관사 태극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깃들어 있을까. 진관사 지주인 법해 스님은 진관사를 거점으로 독립운동을 펼친 백초월 스님의 뜨거운 애국심과 민족 통합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진관사 지주인 법해 스님은 진관사 태극기를 최초 발견한 이야기와 함께 백초월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진관사 지주인 법해 스님은 진관사 태극기를 최초 발견한 이야기와 함께 백초월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진관사에서 발견된 이 태극기는 일제강점기 독립의 뜻을 지켜낸 소중한 민족의 증거물이다.
진관사에서 발견된 이 태극기는 일제강점기 독립의 뜻을 지켜낸 소중한 민족의 증거물이다.
90년 만에 발견된 독립운동의 흔적
2009년 초, 진관사는 부속 전각 중 하나인 칠성각의 해체·복원 사업을 계획했다. 칠성각은 6·25전쟁 때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된 와중에도 기적적으로 화를 면했지만, 폭격의 여파로 인해 건물이 기울어져 있었다. 당시 진관사 총무 스님이었던 법해 스님은 칠성각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어떤 유물이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가 공사 시작 전 작업자들에게 “전각 해체 과정에서 무언가 나오면 꼭 나에게 갖고 오라”고 신신당부했던 이유다.
5월 26일 오전 9시 30분경, 법해 스님이 예견했던 대로 한 작업자가 뭔가를 싸 놓은 듯한 모습의 보자기를 가져왔다. 칠성각의 불단과 벽체 사이에서 나왔다는 보자기는 넣어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보존 상태가 좋았다.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던 법해 스님은 곧 그것이 태극기임을 알아챘다. 태극기의 한쪽 귀퉁이가 불에 탄 자국을 목격한 순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때만 해도 진관사 태극기에 담긴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돌이켜 보면 백초월 스님의 뜨거운 독립 의지가 90년 후의 저에게까지 전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법복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태극기를 온전히 펼치니, 그 안에는 『독립신문』, 『신대한』, 『조선독립신문』, 『자유신종보』, 『경고문』 등 1919년 6월부터 12월까지 발행된 독립신문류 19점이 고이 접힌 채 보관돼 있었습니다.”
법해 스님은 곧바로 진관사를 자주 찾는 동국대학교 문명대 교수(현 한국미술사연구소장)에게 연락했다. 진관사 태극기와 신문을 꼼꼼하게 살펴본 문 교수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귀중한 사료라는 의견을 전했다. 법해 스님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독립기념관 학예사도 감격하며 유물 분석에 돌입했다. 하지만 누가 태극기와 신문을 칠성각에 숨겼는지, 그가 진관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진관사의 중심 법당인 대웅전은 오랜 세월을 품은 단아한 자태로, 불법(佛法)의 가르침과 한국 전통 건축의 정수를 함께 담고 있다.
진관사의 중심 법당인 대웅전은 오랜 세월을 품은 단아한 자태로, 불법(佛法)의 가르침과 한국 전통 건축의 정수를 함께 담고 있다.
의문의 끝에서 만난 백초월 스님
법해 스님은 독립기념관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불교계 독립운동가들을 취합했다. 「님의 침묵」으로 잘 알려진 만해 한용운, 백용성, 이정옥 등과 함께 백초월 스님도 목록에 포함돼 있었다. 이들 중 진관사와 인연이 있는 스님을 어떻게 가려야 할지를 고민하던 법해 스님의 머릿속에 한 노스님이 스쳐 지나갔다. 1919년생이자 일찍이 동자승으로 출가한 뒤 오랫동안 진관사에 머물렀던 스님이었다.
“곧장 스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목록 속 스님들을 아시는지를 여쭸어요. 그런데 다른 스님들은 모른다던 분이 ‘백초월’이라는 세 글자를 듣자마자 반색하면서 ‘알다마다!’ 하셨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오랫동안 불교계 독립운동사를 연구해 온 동국대학교 김광식 교수님과 함께 노스님을 찾아갔는데요. 진관사 태극기와 유물 사진을 보여드리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사진에 삼배하시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셨습니다. 꽤 오랜 기간 백초월 스님의 시중을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노스님은 법해 스님 일행에게 한 일화도 들려줬다. 어느 날 백초월 스님이 경내를 산책하기에 자기도 따라나섰는데, 진관사를 둘러싼 우뚝 솟은 삼각산을 올려다보더니 “우리 조선은 우뚝 솟은 삼각산이고, 일제는 잘 깨지는 계란”이라며 독립의 각오가 담긴 한탄을 중얼거렸다는 것이다.
백초월 스님은 불교의 경전인 『화엄경』에 등장하는 ‘일심(一心)’이라는 구절에서 독립운동의 힌트를 얻었으며, 민족이 한마음으로 단결하면 조국의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했다. 독립운동을 위해 서울로 올라온 그는 진관사를 거점 삼아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항일 단체인 ‘일심회’를 조직해 군자금을 모금하고 인재를 양성한 일이 대표적이다. 그러다 보니 일제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백초월 스님은 1919년 12월 검사국으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한 뒤 풀려났다. 진관사 태극기 속 신문들의 발행 시기와 그가 본격적으로 일제의 탄압을 받기 시작한 시기가 일치하기에,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신문류는 백초월 스님이 그즈음 급하게 칠성각에 숨겼던 것으로 추정된다.
 진관사에서 발행한 신대한 제1호, 그 안에는 일제강점기 민족의 현실을 증언하는 귀중한 역사 자료가 담겨 있다.
진관사에서 발행한 신대한 제1호, 그 안에는 일제강점기 민족의 현실을 증언하는 귀중한 역사 자료가 담겨 있다.
 진관사 태극기의 문양을 담은 기념 배지 세트
진관사 태극기의 문양을 담은 기념 배지 세트
진관사 태극기에 담은 독립과 통합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태극기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귀중하지만, 진관사 태극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진관사 태극기의 태극 문양과 4괘 위치는 현재의 태극기와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이 제정한 태극기의 모양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백초월 스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교류하며 독립운동을 벌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태극기를 만든 과정도 범상치 않다. 새 천에 태극기를 그리는 대신, 일장기 위에 태극 문양과 4괘를 덧그렸다. 법해 스님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작법이 다분히 계획적이라고 강조했다. 태극기를 만들 새 천이 없어서 일장기를 활용한 게 아니라, 일제를 누르고 새로운 조국을 그 위에 세우겠다는 강한 결의를 담은 특별한 태극기라는 것이다.
“진관사 태극기와 백초월 스님의 행적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강한 애국심이 절로 생겼습니다. 백초월 스님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와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절감한, 매우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아울러 백초월 스님은 한민족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일심 사상을 신념화한 분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천한 스님이셨죠. 이런 스님이 만든 태극기인 만큼, 진관사 태극기에는 독립운동의 기상과 통합의 정신이 함께 담겨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선택하신 게 아닐까요?(웃음)”
법해 스님은 “백초월 스님의 일심 사상이 한민족의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그 유산을 면면히 계승하면 사회 통합뿐만 아니라 평화통일에도 일조할 수 있다”며, 진관사도 우리나라가 직면한 두 과제를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 서울 근교 4대 명찰(名刹)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초월 스님은 1944년 옥고를 치르다가 입적(入寂)했지만, 그가 진관사 태극기에 담은 독립 의지와 통합 정신은 시대를 초월해 살아 숨 쉬며 오늘날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