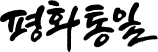남한보다 국력이 약한 북한,
어떻게 남북한 경쟁 관계를 유지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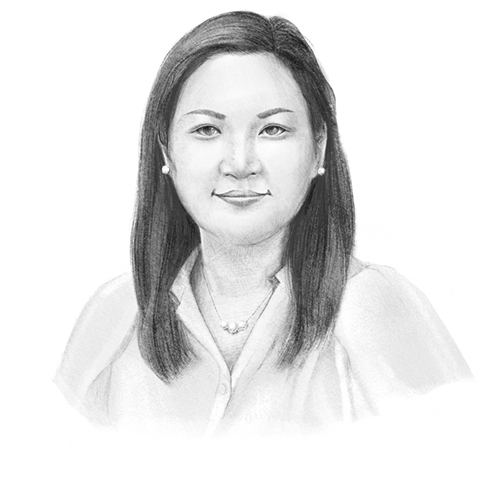
2023년 12월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 현재까지 남북한 경쟁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의 동맹을 발전시키며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행보를 걷고 있다. 이는 북한이 남한보다 최소한 경제사회적 국력이 월등히 미약한 상황에서 남북한 경쟁을 주도하기 위한 행보이다. 그렇다면, 국력의 차이가 큰 북한과 남한은 어떻게 경쟁 관계를 유지하는가? 세계적으로 ‘비대칭적 국력을 가진 국가들 간 경쟁’을 연구한 드레이어(David R. Dreyer 2014)는 강대국과의 동맹과 핵무기 외에 여러 요인을 주목한다. 이중 남북 경쟁에 함의가 높은 요인을 살펴보자.
첫째, 더 강한 국가의 다른 라이벌의 선점이다. 더 강한 국가에 다른 라이벌이 생기면 전력이 분산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와의 힘의 균형이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일 관계의 적대성이 커지면 남북 관계에서 북한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둘째, 분쟁 중인 이슈와 관련한 힘의 동등성이다. 주요 쟁점이나 이슈와 관련하여 상대적 동등성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북한이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을 추진한다면, 국제적으로 6·25전쟁 종결 시 국제연합군을 대표하는 미국, 참전한 중국과 함께 정전협정(1953.7.27.) 당사자로 참여한 북한이 한국보다 분쟁 중인 이슈 관련 주도력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약한 국가의 결의이다.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에 비해 약한 국가의 결사의지가 크다면 힘의 동등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북한 정권이 일상적으로 군대와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고조시키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약한 국가의 뛰어난 군사 전술이다. 전력이 다소 약하더라도 뛰어난 군사 전술을 활용하면 전쟁 또는 군사 대립 시 우월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들은 전력이 더 강한 국가에 대한 군사 전술 마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김정은 정권이 대남 우월성 입증과 대남 위협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대남 전술핵 전략이나 산악지대와 지하를 활용한 ‘게릴라 전술’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양상 등이다.
다섯째, 약한 국가 자신의 힘에 대한 과대평가다. 약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와의 라이벌 관계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힘에 대한 과대평가를 한다. 이를 통해 힘의 동등성을 이루려는 것이다.
여섯째, 약한 국가의 현상 유지에 대한 불만이다. 약한 국가는 라이벌인 상대 국가가 ‘자신보다 국력이 강하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이에 따라 약한 국가는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도전/도발을 강한 국가보다 더 자주 실행한다. 북한의 대남·대외 도발의 양상을 보면 김정은 정권의 현상 유지에 대한 불만을 확인할 수 있다.
일곱째, 시간에 따른 힘의 변동이다. 어떠한 권력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권력 변동이 반드시 경쟁의 종결로 이어지지 않고도 권력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다. 즉, 경쟁관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정권교체 등으로 인한 힘의 동등성과 관련한 특징이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모두 독재정권일지라도 남북관계는 각 정권에 따라 일정한 변동을 보여 왔고, 남북한 힘의 동등성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요인을 숙고하면 북한의 행태를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적대성 고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의 과제에 보편적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평화통일 칼럼은 『평화통일』
기획편집위원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