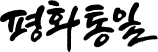70년을 간직한 전우애의 기적
전장 속 약속을 지킨 황규만 장군의 마지막 소원
고(故) 황규만 장군 외손녀 정지희 씨의 회상
국립서울현충원엔 70년 세월을 넘어 나란히 잠든 두 전우가 있다. 고(故) 황규만 전 육군정보처장 (이하 ‘황규만 장군’)과 고(故) 김수영 소위다. 6・25 전쟁에서 함께 조국 수호에 나선 인연은 오래도록 변치 않은 우정이자 감동적인 약속으로 승화해 널리 알려졌다. 황규만 장군 외손녀인 정지희 씨의 회상을 따라 그 위대하고도 숭고한 역사를 돌이켜 본다.
 황규만 장군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는 맏딸 황혜성 씨는 강직하면서도 따뜻한 성품을 가진 아버지를 회고했다.
황규만 장군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는 맏딸 황혜성 씨는 강직하면서도 따뜻한 성품을 가진 아버지를 회고했다.
 황규만 장군은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경험한
세대로서 평화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후대에
교훈을 남기고자 했다.
황규만 장군은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경험한
세대로서 평화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후대에
교훈을 남기고자 했다.
 황규만 장군은 육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소위로 임관해
전쟁에 참전했다.
황규만 장군은 육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소위로 임관해
전쟁에 참전했다.
계급장마저 달지 않은 채 전장에 나섰던 전우의 자취를 찾아
지난 2020년 6월 21일, 89세의 황규만 장군이 별세했다. 미국 육군보병학교와 육군참모대학교에서 군사교육을 이수하고 육군정보처장, 대한민국 육군대학 교수부장 등을 역임한 그의 마지막 당부는 단 하나였다. 이름조차 새겨지지 않은 ‘육군소위 김의 묘’ 옆에 묻히고 싶다는 소원이었다.
두 군인이 처음 만난 때는 6・25 전쟁이 일어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1949년 육군사관학교 생도 1기(훗날 육사 10기)로 임관한 황 장군은 갓 스무 살의 나이에 조국을 지키고자 참전했다. 1950년 8월 27일 수도사단 6연대 소속 소위였던 그가 경상북도 안강지구 도음산 384고지에서 한창 북한군과 맞서고 있을 때였다.
“당시 할아버지는 이틀 혹은 사나흘 굶기가 예사인 전장에서 숨죽이며 대치하던 중 적군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계급장마저 달지 않은 지원부대를 맞이했습니다. 그 부대를 이끈 소대장이 바로 김 소위님이었다고 해요.”
장군의 외손녀인 정지희 씨에 따르면, 서로 미처 통성명할 시간 없이 작전 수행에 몰두해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형 정찰을 위해 몸을 일으킨 순간, 김 소위는 예상치 못한 북한군의 기관총 사격으로 인해 곧 전사했다. 당장 현장을 떠나야 할 상황이기에 장군은 다급히 소나무 아래 그를 임시로 묻은 다음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맹세하며 커다란 돌을 표식 삼았다. 훗날 밝혀진 사실이지만, 김 소위를 포함해 무려 1,500명에 이르는 청년이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산화한 전쟁이었다. 살아생전 황 장군은 이렇게 회고한 바 있다.
‘좀처럼 그를 잊을 수 없더라고. 내가 두 손에 피를 묻혀가며 묻었는데, 그럴 수 없지.’
 조선일보에 소개된 황규만 장군의 전우애 이야기
조선일보에 소개된 황규만 장군의 전우애 이야기
 황규만 장군은 생전에 김 소위의 묘 옆에 묻히기를 희망했고, 2020년 6월 21일 별세하여 그의 유언대로 김수영 소위의 묘 옆에 안장됐다.
황규만 장군은 생전에 김 소위의 묘 옆에 묻히기를 희망했고, 2020년 6월 21일 별세하여 그의 유언대로 김수영 소위의 묘 옆에 안장됐다.
26년 만에 찾은 이름··· 그 희생과 조국을 위해 살았던 숭고한 나날
1953년 7월 마침내 전쟁은 휴전협정을 계기로 멈췄으나 시대는 여전히 어수선했다. 황규만 장군이 1964년에 이르러서 전우를 다시 찾은 이유다. 김 소위의 유해는 그해 5월 29일 현충원으로 옮겨져 안장했으나 정작 이름을 알지 못해 묘비엔 ‘육군소위 김의 묘’라고 새길 수밖에 없었다.
“김 소위님을 무명 전사자로 남겨두지 않으려고 할아버지께서 무던히 애쓰신 기간만 햇수로 26년입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그분 묘에 들렀고, 동시에 정확한 성함 확인에 적극적으로 나섰죠.”
정지희 씨는 드디어 1990년 ‘1922년생 김수영’이란 신원 파악에 성공한 장군의 밝은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육군 갑종 간부 후보생 1기 동기를 수소문한 끝에 비로소 마주한 쾌거였다. 이어서 유가족까지 만나 그간 못다 전한 사연을 나눌 수 있었다.
1976년 3월 준장으로 전역한 황 장군은 1985년 전장이었던 도음산에 김 소위를 기리는 전적비를 세웠다. 아울러 조국과 국군이 부르는 곳이면 어디서든 앞장서 활약했다. 한문과 영어, 일본어 등에 통달한 그는 좋은 책을 후학에게 널리 읽히는 차원에서 번역하기도 했다. 에르빈 롬멜이 선보인 저서 <롬멜보병전술>, 리델 하트가 쓴 <롬멜전사록>과 <현대육군의 개혁>, 아서 브라이언트의 <워 다이어리> 등 2차세계대전을 다룬 각종 서적은 대표적인 결실이다. 특히 최근 <롬멜보병전술>이 진중문고 채택의 영예를 안았다며, 밝게 웃는 정지희 씨는 이렇게 덧붙인다.
“제가 기억하는 할아버지는 제게 대내외적으로 언어와 학문을 폭넓게 익혀 우리 사회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6・25 전쟁을 겪은 세대는 배우고 싶어도 여건이 따르지 않았던,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며 평온한 일상을 당연시하지 않고 감사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서울현충원에 있는 황규만 장군님의 요역앞에 서 있는 증손자의 모습이다.
서울현충원에 있는 황규만 장군님의 요역앞에 서 있는 증손자의 모습이다.
 1952년 미 보병학교 유학시절
1952년 미 보병학교 유학시절
오늘날 맞이한 자유와 평화로 대한민국의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는 꿈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참 군인이자 전우애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황규만 장군은 호국영령의 희생을 잊지 않았다. 또한, 자신을 ‘빚진 인생, 덤으로 사는 삶’이라고 표현하며 김수영 소위와 같이 꿈꿨던 평화로운 우리나라를 더욱 잘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하곤 했다.
“할아버지는 품에 안은 손녀가 커 가는 모든 과정과 순간에 있어 김 소위님의 희생을 떠올리신 듯했습니다. 그분을 비롯해 전장에서 목숨 바친, 수많은 군인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오늘이 과연 있었을까요?”
2022년 6월 6일 제67회 현충원 추념식에서 정지희 씨는 할아버지 황 장군과 김 소위의 일화를 담은 편지 <할아버지의 약속>을 썼다. 이 메시지는 배우 전미도가 낭독해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저는 권위에 연연하지 않은 군인이자, 늘 겸손한 자세로 연구하는 학자였던 할아버지에게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언제나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처럼 지금 느끼는 자유와 평화, 행복 등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더 밝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가야겠습니다.”


 그는 6·25 전쟁 중 전사한 전우 김수영 소위를 결코 잊지 않았고, 50년 넘는 세월 동안 그의 묘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6·25 전쟁 중 전사한 전우 김수영 소위를 결코 잊지 않았고, 50년 넘는 세월 동안 그의 묘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황규만 장군이 외손녀에게 남긴 소중한 유산!
‘올바른 가치관’

“저는 할아버지가 생전 몸소 보여주신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올바른 가치관을 이어받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제 아이가 본받을 수 있다면 더없이 값질 듯합니다. 또한, 제가 현재 캐나다에서 다문화 다인종으로 구성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6·25전쟁 참전국 출신 동료 여러분에게 고국의 희생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알리면서 할아버지의 따스한 전우애를 지속해서 전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