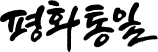대화의 율격과 공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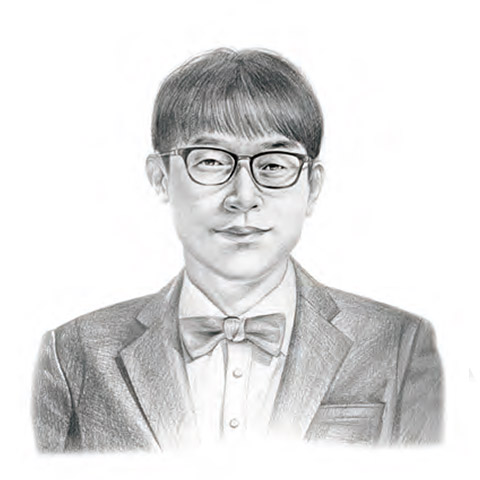
청소년들이 ‘욕’을 많이 하는 이유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도덕성이 부족해서만은 아니다. 기성세대가 ‘욕’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와 구분 짓기 위한 전략으로 ‘욕’을 선택하는 것이다. 기성세대가 쓰지 않는 ‘욕’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성세대와 다름을 확인하는 전략적 행위인 것이다.
언어는 단지 나의 의사를 드러내거나 생각을 담는 그릇이 아니다. 언어는 세계를 규정하고, 행동을 지배하며, 상대와의 관계를 구성하거나 권력관계를 드러낸다. 그렇기에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이 달라지면 언어 전략도 달라진다. 청자의 인지 환경(Cognitive Environment)이 달라지면 새로운 전략을 구사한다.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욕을 많이 하던 학생이라도 대학에 들어가면 욕을 사용하지 않는다. 갑자기 철이 들었거나 도덕성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다. 대학에서는 욕을 통해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욕을 사용한 대화는 아직 미성숙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언어가 연행되는 유통 환경이 달라졌기에 전략적으로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다.
발화자가 발신하는 메시지는 청자의 인지 환경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언어 행위는 발화자의 언어가 갖는 명제적인 의미와 문장이 발화된 맥락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해석된다. 말한 사람의 의도나 상호 간에 알고 있는 배경지식이나 문화적 환경은 언어 행위의 해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화에서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이다.
언어철학자 허버트 폴 그라이스(Herbert Paul Grice)는 사람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따르는 암묵적인 규칙으로 ‘대화의 원리(Cooperative Principle)’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양의 격률(Maxim of Quantity)이다. 대화에서는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필요한 만큼만 말하라’는 원칙이다. 둘째는 질의 격률(Maxim of Quality)이다. ‘거짓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지 마라’, ‘증거가 없는 말을 하지 마라’는 원칙이다. 셋째는 관계의 격률(Maxim of Relation)이다. ‘대화의 주제와 관련 있는 말만’ 하라는 것이다. 넷째는 방법의 격률(Maxim of Manner)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하라는 것이다.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순서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피하라는 원칙이다.
이성범은 『소통의 화용론 :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화용적 접근』(한국문화사, 2016)에서 의사소통을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구성 요소와 이 요소들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체계’로 사회문화적 관점을 설명한다. 전통적으로 의사소통은 ‘일종의 기술(Skill)로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화법을 다듬는 것이 중요’하다는 수사학적 관점이었다. 반면,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의사소통을 ‘사회 질서(Social order)를 재생산’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규범이나 관습, 제도 등은 의사소통의 산물이고, 이 산물을 끊임없이 재생산된다는 관점이다. 대화에서 주고받는 정보나 메시지는 이미 굳어진 의미를 가지고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 작용하면서, 의미가 새롭게 창조되거나 재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의사소통 과정에서 청자는 화자의 의도를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스스로 새로운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화자는 그러한 청자의 태도를 틀렸다든지, 무식하다든지, 또는 무책임하다고 나무라기만 해서는 진정한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화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장만이 아니라 함축된 의미를 포함해서, 화자가 그 일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 발화를 해야 요청 행위가 성립한다’는 성실성의 조건과 “‘무례하다’고 믿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공손하다’고 믿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공손의 원리가 필요하다.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 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화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격률과 공손의 원리가 작동하는 대화가 중요하다.
※ 평화통일 칼럼은 『평화통일』
기획편집위원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