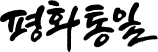이 땅의 상처와 치유 속
평화의 가치를 심다
 제16회 국립대전현충원 사진공모전 은상작 ‘현충원과 아이들’
제16회 국립대전현충원 사진공모전 은상작 ‘현충원과 아이들’
이 땅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전협정으로 멈춘 총성이지만 분단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 역사의 무게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아 있다.
1956년, 6·25전쟁의 상처 위에 세워진 이곳은 단지 국가유공자들을 안장한 국립묘지 이상의 공간으로 ‘기억’을 전시하는 장소다. 충혼당과 현충관에 보관된 유품들, 전사자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한 장, 흐릿한 흑백사진 한 장은 전쟁의 진실을 말한다. 그것은 숫자나 통계로는 담을 수 없는,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의 얼굴과 이야기로 다가온다.
오늘날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다수가 된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평화는 전쟁을 모르는 이들에 의해 더욱 단단히 지켜져야 한다. 전쟁의 기억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전쟁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현충원이 단순한 묘역이 아닌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곳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마지막 주소’이자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우리의 ‘첫 번째 약속’이다.
특히 가치 혼란과 공동체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국립서울현충원이 지니는 정신적, 교육적, 문화적 의미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이 공간은 대한민국이 어디에서 왔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자 이정표다. 정체성과 가치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이곳을 찾게 될 것이다.
6·25전쟁 75주년과 분단 80년을 맞아 전쟁의 기억을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다시금 되짚어봐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쟁을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 현충원’을 소개하며 그 가치를 재조명했다. 또한 좌담에서는 실향민 3세, 참전용사 후손, 북한이탈주민 교사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교육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 세대가 경험하거나 전해 들은 전쟁의 상흔을 나누고, 후손들에게 전해야 할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논의했다. 아울러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