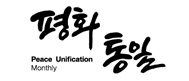평화통일 칼럼
통일인지 능력을 키우자
“북한 주민 두 명, 남한 주민 두 명, 추천해주세요.” 남북이 경색된 상황에 북한 주민 두 명을 추천해달라는 전화는 뭔가. 알고 보니 남북대화 마당에 필요한 탈북민 두 명을 추천해달라는 부탁이다. 이 업무에 익숙한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다니 마땅치 않다. 이 말을 들은 탈북민 왈, 얼마나 더 살아야 우릴 한국 사람으로 쳐주냐고 금방 뾰로통해진다. 북한에서 15년, 한국에서 25년 살았는데도 소개할 때마다 탈북민이라고 한단다.
탈북민들은 새터민이란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남한에서 산 당신들은 헌터민이냐고 대뜸 쏴붙인다. 우린 왜 북한에서 온 같은 민족에게 ‘탈’자를 붙일까? 미국서 오래 산 친구가 최근 한국 땅에 다시 정착했다. 그 친구보고 ‘탈미인’이라고 불렀더니 의아해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일본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교포를 ‘탈일인’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는 유독 북한에서 온 동포에게는 탈북민이라고 ‘탈’자를 붙인다. 고향이 북한인데 지금 우리랑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풀어 얘기하면 안 될까?
이산가족 상봉 때마다 ‘작별 상봉’이란 단어를 언론에선 아무렇지 않게 쓴다. 혈육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상봉을 잔인한 작별 상봉으로 마감하는 그 당사자들의 맘을 생각하면 그 표현을 함부로 쓸 수가 없다. 차라리 ‘기약 상봉’이라고 하면 안 될까? 이산가족의 재상봉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참으로 못마땅하다. 13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 신청자가 한 번씩 모두 만난 후 재상봉이 가능하다는 셈법으로 이산가족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는 누군가. 화상 상봉 횟수를 담당 부처의 성과로 게시하는 성과주의 사고도 딱하다. 이젠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방송국 일기예보는 북한 지역을 남의 나라 소개하듯 가끔 몇 군데 소개한다. 통일 운운하면서 일기예보는 여전히 분단 지향이다. ‘통일전망대’, ‘남북의 창’과 같은 북한 관련 프로그램은 토요일 이른 아침, 그것도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한다. 시청자들이 북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주는데도. ‘이제 만나러 갑니다’도 예전 같지 않다. 북에서 온 출연자는 대폭 줄고, 정치인, 예능인들이 주로 나온다. 예능 속에서 북한 실상은 한 번 더 왜곡되는 인상을 준다.
분단 이후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다. 그런데 통일이 요원하고 분단이 고착되다 보니 통일은 소원에 머물고, 분단 극복에 필요한 통일인지 능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동질성을 회복하고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일인지 능력인데도 말이다. 나와 달리 살아온 ‘반쪽’과 함께할 수 있는 포용력도 부족하고, 그런 반쪽과 함께하는 상황에서 벌어질 상상력도 많이 모자란다. 통일 상상력 부족은 통일 미래를 내다보는 여러 행사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북한에서 전학 온 학생 때문에 남한 교실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는 있어도, 남한 학생이 북한으로 전학 가서 일어나는 사례는 아직 없다.
분단의 깊은 상처를 흉터로 남지 않게 할 ‘상처치유 능력’이 통일인지 능력의 핵심이다. 통일 상대방도 제대로 모르면서 통일하면 그 후유증은 감당하기 어렵다. 분단 78년이 남긴 단절은 화해할 줄 모르는 반쪽들을 낳았다. 북한을 제대로 알면 통일이 보이는데, 북한도 모른 채 지금도 통일만 노래한다. 설상가상 북한 실상도 모르는데 북한인권을 강조한들 그게 들리겠는가.
※ 평화통일 칼럼은 「평화통일」 기획편집위원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새터민이란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남한에서 산 당신들은 헌터민이냐고 대뜸 쏴붙인다. 우린 왜 북한에서 온 같은 민족에게 ‘탈’자를 붙일까? 미국서 오래 산 친구가 최근 한국 땅에 다시 정착했다. 그 친구보고 ‘탈미인’이라고 불렀더니 의아해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일본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교포를 ‘탈일인’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는 유독 북한에서 온 동포에게는 탈북민이라고 ‘탈’자를 붙인다. 고향이 북한인데 지금 우리랑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풀어 얘기하면 안 될까?
이산가족 상봉 때마다 ‘작별 상봉’이란 단어를 언론에선 아무렇지 않게 쓴다. 혈육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상봉을 잔인한 작별 상봉으로 마감하는 그 당사자들의 맘을 생각하면 그 표현을 함부로 쓸 수가 없다. 차라리 ‘기약 상봉’이라고 하면 안 될까? 이산가족의 재상봉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참으로 못마땅하다. 13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 신청자가 한 번씩 모두 만난 후 재상봉이 가능하다는 셈법으로 이산가족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는 누군가. 화상 상봉 횟수를 담당 부처의 성과로 게시하는 성과주의 사고도 딱하다. 이젠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방송국 일기예보는 북한 지역을 남의 나라 소개하듯 가끔 몇 군데 소개한다. 통일 운운하면서 일기예보는 여전히 분단 지향이다. ‘통일전망대’, ‘남북의 창’과 같은 북한 관련 프로그램은 토요일 이른 아침, 그것도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한다. 시청자들이 북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주는데도. ‘이제 만나러 갑니다’도 예전 같지 않다. 북에서 온 출연자는 대폭 줄고, 정치인, 예능인들이 주로 나온다. 예능 속에서 북한 실상은 한 번 더 왜곡되는 인상을 준다.
분단 이후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다. 그런데 통일이 요원하고 분단이 고착되다 보니 통일은 소원에 머물고, 분단 극복에 필요한 통일인지 능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동질성을 회복하고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일인지 능력인데도 말이다. 나와 달리 살아온 ‘반쪽’과 함께할 수 있는 포용력도 부족하고, 그런 반쪽과 함께하는 상황에서 벌어질 상상력도 많이 모자란다. 통일 상상력 부족은 통일 미래를 내다보는 여러 행사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북한에서 전학 온 학생 때문에 남한 교실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는 있어도, 남한 학생이 북한으로 전학 가서 일어나는 사례는 아직 없다.
분단의 깊은 상처를 흉터로 남지 않게 할 ‘상처치유 능력’이 통일인지 능력의 핵심이다. 통일 상대방도 제대로 모르면서 통일하면 그 후유증은 감당하기 어렵다. 분단 78년이 남긴 단절은 화해할 줄 모르는 반쪽들을 낳았다. 북한을 제대로 알면 통일이 보이는데, 북한도 모른 채 지금도 통일만 노래한다. 설상가상 북한 실상도 모르는데 북한인권을 강조한들 그게 들리겠는가.
※ 평화통일 칼럼은 「평화통일」 기획편집위원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 영 수
북한연구소장 / 서강대 명예교수
김 영 수
북한연구소장 / 서강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