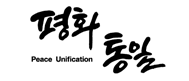위영금 지음/ 300쪽/들녘
위영금 지음/ 300쪽/들녘
북한 리얼 스토리
쩡한 김장김치, 꼬장밥 맛을 아십니까?
밥 한번 먹자는 말에 울컥할 때가 있다
우리는 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모른 척하기 힘든 사람을 우연히 만났을 때 ‘언제 밥 한번 먹자’고 말한다. 진짜로 밥을 먹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친분을 쌓는 것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나는 당신과 소통하고 좋은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함경남도 고원군 수동구 장동. 무연탄을 생산해 함흥 화학공업기지에 보내는 규모가 큰 ‘고원탄광’으로 유명하다. 1998년에 탈북, 현재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저자 위영금 씨의 고향이다. 부모님은 중국에서 살다 1960년대 북한으로 들어갔다. 탈북하기 전까지 세 번을 이사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무거운 김장독을 깨지지 않도록 가보처럼 싸서 이삿짐에 실었다. 새로 이사한 집에 김장독 묻을 자리가 넉넉하면 어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북쪽에서는 대개 김장을 반년 치 식량으로,함경남도 고원군 수동구 장동. 무연탄을 생산해 함흥 화학공업기지에 보내는 규모가 큰 ‘고원탄광’으로 유명하다. 1998년에 탈북, 현재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저자 위영금 씨의 고향이다. 부모님은 중국에서 살다 1960년대 북한으로 들어갔다. 탈북하기 전까지 세 번을 이사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무거운 김장독을 깨지지 않도록 가보처럼 싸서 이삿짐에 실었다. 새로 이사한 집에 김장독 묻을 자리가 넉넉하면 어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가구당 톤(t)으로 담는다. 오죽하면 김장을 ‘전투’라고 했을까?
서리가 내리면 서둘러 김치를 담그려고 분주히 움직인다.
어마한 배추를 쌓아놓고 절이고 양념하고 움에 넣는 것까지 꼬박 일주일이 걸린다.”
북쪽 지방으로 올라갈수록 김치는 물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김치를 버무리고 며칠 후 국물을 만들어 넣기 때문이다. 한겨울 살얼음을 손으로 슬슬 밀어내고 발그레한 김칫국물까지 푹 퍼 담아 먹으면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하다. 탈북민들은 이를 ‘쩡한 맛’이라고 한다. ‘시원하고 아삭한 맛’을 뜻하는 북한식 표현이다. 남쪽에서는 도저히 이 맛을 찾을 수 없다. 그 시절 온 몸이 기억하는 그 쩡한 맛은 언젠가 고향을 찾아갔을 때나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장마당 두부밥과 인조고기밥은 생명줄”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것은 1990년 중반 이후다. 10여 년간 최악의 식량난으로 약 33만 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산된다. 배고픔의 고통은 정치 체제부터 인륜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 특히 철저하게 차단된 북한 같은 체제하에서는 더 심할 수밖에 없다. 이때 등장한 것이 ‘두부밥’과 ‘인조고기밥’이다.
“두부밥은 두부를 삼각으로 잘라 기름에 튀겨서가운데 칼집을 내고 쌀밥을 한 주먹 넣고 양념을 올리는 것이다.
두부밥은 한 개를 먹어도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어려운 시기에 개발된 영양 만점 음식이다.
인조고기는 콩으로 만든다. 부드럽고 단백질이 풍부하다.
길게 빚어 나온 재료를 두부밥처럼 적당한 크기로 잘라 밥을 넣고 양념을 올린다.”
굶주림이 일상을 덮치자 많은 사람들이 그저 먹을 것을 찾아 나섰다. 존재도 없던 장마당이 생긴 것도, 새로운 음식이 등장한 것도 이때부터다. 살기 위해 집을 나온 아이들은 장마당을 배회하며 음식을 훔칠 틈새만 노렸다. 두부밥 하나를 먹겠다고 사람들은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 어려운 시기 장마당과 그곳에서 파는 두부밥과 인조고기밥은 생명줄이었다.
함흥으로 시집간 언니가 친정집에 두 딸을 맡기고 갔다. 돈 벌어 돌아온다던 언니는 몇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얼마 후 장사 밑천까지 모두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다. 모진 마음을 먹고 집에 남아 있는 강냉이 가루를 털어 ‘꼬장떡’을 빚었다. 마침 함흥으로 가는 인편이 있어 조카들을 딸려 보냈다. 내가 살겠다고 조카를 떠나보낸 죄책감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다.
“옥수수 가루로 만들어 식으면 꼬장꼬장 굳어져 꼬장떡이다.함흥으로 시집간 언니가 친정집에 두 딸을 맡기고 갔다. 돈 벌어 돌아온다던 언니는 몇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얼마 후 장사 밑천까지 모두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다. 모진 마음을 먹고 집에 남아 있는 강냉이 가루를 털어 ‘꼬장떡’을 빚었다. 마침 함흥으로 가는 인편이 있어 조카들을 딸려 보냈다. 내가 살겠다고 조카를 떠나보낸 죄책감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다.
가루만 있으면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모양도 둥글납작하게 만들어 세 손가락 도장을 찍기도 했다.
꼬장떡은 쪄내지 않고 반죽하여 가마에 빙 둘러 붙인다.
김을 올리면 구수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꼬장떡은 길 떠나는 사람에게 생명과 같은 양식이었다. 살기 위해 무거운 배낭을 지고 굳어진 꼬장떡을 조금씩 깨물어 먹으며 수십 리 길을 걸어야 했다. 집에 남은 아이도 엄마를 기다리며 꼬장떡을 먹었다. 꼬장떡을 다 먹도록 엄마가 돌아오지 않으면 굶거나 길을 나서야 했다. 그때는 강냉이가 얼른 자라서 꼬장떡이라도 먹게 되기를 모두가 간절히 기다렸다.
“北에서 가족과 함께한 밥상이 최고”
아버지는 의사였지만 당원은 아니었다. 당원이 되지 못한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늘 열심히 일했다. 평소에는 말수가 적었지만 술만 들어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유머를 구사했다. 막내딸을 중국으로 보내기 위해 두만강을 몇 번이나 건넜다. 1999년 2월 중국에 같이 있던 아버지는 내리는 눈을 어깨에 맞으며 어둠 속으로 멀어져갔다. 북한으로 돌아간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다. 이후 연락도 생사도 알 수 없었다.
얼떨결에 연변의 조선족, 시할아버지부터 삼대가 살고 있는 대가족의 며느리가 됐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 홀로 던져진 것 같은 불안과 생각지도 않은 결혼이었다. 마땅하지 않은 현실은 힘들었다. 그렇지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노력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메로 치는 찰떡 덕분에 정(情)이 붙었다. 익숙한 맛이 그곳에 머물게 했다. 통하는 언어, 쫓기는 생활이 불안해도 백배는 나은 삶의 질, 그리고 어느 순간 아들이 찾아왔다.
저자는 이제 아무 때나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밥은 먹고 다니냐?’며 건성으로 건네는 한마디에 문득 눈물이 핑 돌때가 있다고 한다. 다 먹고살자고 하는 노릇인데, 겨울에는 김치밥과 나물밥으로 버텼고 고난의 행군 시기는 그야말로 먹지 못해 죽은 시간이었다. 그때, 그저 쌀밥 한 숟가락 먹는 것이 소원이었다.
풍요로운 남쪽 생활에도 빈자리를 채울 수 없는 마음 그 언저리에는 고향을 떠나온 자, 돌아갈 수 없는 자의 슬픔이 자리 잡고 있다. 최고의 맛은 사람과 시간, 장소가 함께 만들어낸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맛을 오랫동안 추억하며 이야기한다. 남쪽의 다양하고 낯선 음식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저자는 여전히 북한에서 가족과 함께했던 그 시절 밥상을 최고의 맛으로 꼽는다.
얼떨결에 연변의 조선족, 시할아버지부터 삼대가 살고 있는 대가족의 며느리가 됐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 홀로 던져진 것 같은 불안과 생각지도 않은 결혼이었다. 마땅하지 않은 현실은 힘들었다. 그렇지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노력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메로 치는 찰떡 덕분에 정(情)이 붙었다. 익숙한 맛이 그곳에 머물게 했다. 통하는 언어, 쫓기는 생활이 불안해도 백배는 나은 삶의 질, 그리고 어느 순간 아들이 찾아왔다.
저자는 이제 아무 때나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밥은 먹고 다니냐?’며 건성으로 건네는 한마디에 문득 눈물이 핑 돌때가 있다고 한다. 다 먹고살자고 하는 노릇인데, 겨울에는 김치밥과 나물밥으로 버텼고 고난의 행군 시기는 그야말로 먹지 못해 죽은 시간이었다. 그때, 그저 쌀밥 한 숟가락 먹는 것이 소원이었다.
풍요로운 남쪽 생활에도 빈자리를 채울 수 없는 마음 그 언저리에는 고향을 떠나온 자, 돌아갈 수 없는 자의 슬픔이 자리 잡고 있다. 최고의 맛은 사람과 시간, 장소가 함께 만들어낸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맛을 오랫동안 추억하며 이야기한다. 남쪽의 다양하고 낯선 음식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저자는 여전히 북한에서 가족과 함께했던 그 시절 밥상을 최고의 맛으로 꼽는다.